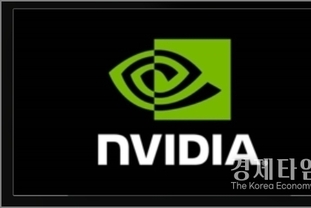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밤늦게 주문해도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도착하는 이른바 ‘새벽배송’ 서비스를 둘러싸고 노동강도와 사회적 책임을 놓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해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노동자·소비자·기업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주말 자정을 넘긴 시각, 쿠팡의 한 물류센터. 새벽배송 기사 A씨는 당일 배송할 물품을 찾는 분류 작업부터 시작했다. 예전보다 단순화됐다고는 하나, 분류작업만 1시간 이상 소요된다. 문제는 이 작업이 ‘무임금 노동’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신선식품을 담는 전용 백(프레시백) 회수와 정리 역시 배송기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업무 부담은 더 크다.
A씨는 “프레시백 회수만 없어도 업무 강도가 엄청나게 줄 것”이라며 “일하는 중간에 휴식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시간에 잠깐 숨을 고르는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날 A씨가 처리해야 할 배송 물량은 약 200건. 주말이라 ‘적은 편’이라는 설명이 덧붙었지만, 여전히 물량 대비 시간은 촉박하다. 음료 박스 5개를 한 번에 들고 이동하고, 느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문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 물건을 내려놓고 사진을 촬영하는 동작까지 모두 초 단위로 움직여야 한다. 새벽 7시 이전 배송 완료가 원칙이어서 기사들은 물류센터와 배송지를 하루 2~3회 반복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9.7시간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산업재해 판정 기준에 따라 야간 근무시간을 30% 가중할 경우 실제 노동시간은 12시간을 넘는다. A씨는 “새벽배송을 하다 보면 삶을 갉아먹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야간 배송이 없어지면 일자리를 잃는 것이기에 서로 개선할 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노동 환경 문제는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논의 과정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택배업계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 금지’, ‘분류작업 배제’ 등에 합의했으나 새벽배송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은 협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준은 업계 전반에서 준수되고 있다는 것이 쿠팡 측의 설명이다.
최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초심야(자정~새벽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소비자 단체에서는 새벽배송 금지 논쟁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택배기사 과로 문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있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11월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애초 새벽배송을 전제로 과로사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새벽배송 금지를 논의한 적이 없는데 정치적 이슈 만들기 차원에서 논쟁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계 제안의 취지 또한 ‘금지’가 아니라 “주간과 야간 노동을 합리적으로 배합해 초심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이라며 “새벽배송 자체를 없애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벽배송이 주요 영업 모델인 기업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화만으로는 배송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업체들이 새벽배송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사회적 대화로 일괄 중단시킬 수는 없다”며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격주 주 5일제’ 도입 등 휴식 보장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은 물류 서비스의 속도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소비자의 편익,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